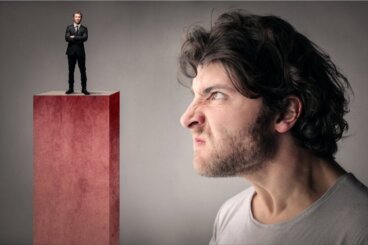내 몸과 화해하고 사는 법 배우기

2021년 발표한 유네스코 연구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외모 때문이라고 한다. 심리적 괴롭힘은 유럽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며 특히 소녀들이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및 사회적 배제를 포함하는 이러한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을 직접 겪은 글쓴이의 ‘내 몸과 화해하고 사는 법’을 배워 보자.
오늘날 사회는 마른 몸매를 선호하며 과체중을 폄하한다. 그 영향으로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물론 미디어와 광고 또 SNS상에서도 지인, 낯선 사람 또는 일부 전문가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런 외모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한 심리적 결과가 따른다. 자존감 결여, 사회적 고립, 죄책감, 자기 수용 부족, 섭식 장애, 신체 기형 등의 결과는 삶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자존감을 낮춘다.
나는 무려 31년 동안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했다.
더 읽어보기: 어떤 모습이든 내 몸을 사랑하는 순간

내 몸과 내 인생
언니가 내 경험담을 쓰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니 아주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나는 줄곧 과체중이었고 체중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가족에게 처음 경멸적인 발언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말로 내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사람이 많았다.
불행한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7살 때쯤 가족 모임에서 제일 좋아하는 생선 구이를 시켰더니 몇몇 친척이 다이어트 중이냐며 칭찬했다. 또 체육 선생님이 내가 저울에 올라가면 체중계가 부서지겠다고 한 적도 있다.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내 배에 재미로 공을 던지기도 했다. 십 대 때 처음 반바지를 입었을 때는 어느 친구가 역겹다는 듯 내 다리를 본 적도 있고 밤에 파티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데 일부 승객이 나를 역겨운 뚱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준 여러 사건들을 차츰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즉, 그러한 경험은 내 삶의 일부를 형성하고 상처를 줬으며 나를 어느 정도 길들였다.
나 자신과의 싸움
평생 과체중이었던 내게 무가치하다거나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살을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날씬해야만 사랑받고 취업이 쉬우며 존중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믿게 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은 절정에 이르렀다.
점점 숫기를 잃고 내성적으로 되면서 사회 생활이 어려워졌다. 많은 일상 활동이 나를 마비시키는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나는 내 몸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 큰 옷을 입었고 불안,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내 일상의 일부가 됐다.
피난처이자 고통이 된 음식
대부분은 음식을 즐기며 이러한 점을 비난받지 않지만 몸매가 날씬하지 않으면 식단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두려움까지 유발할 수 있다.
내게 음식은 안식처이자 고통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몰래 폭식을 했는데 강박적인 폭식은 불안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음식에만 집중하면 다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폭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나를 파괴하며 점점 더 빠르게 폭식하고 후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더 읽어보기: 신체적 증상이 수반된 우울증: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내 몸과 화해하는 법 배우기
감자칩 몇 봉지 , 햄버거 두 개, 피자 한 판, 아이스크림 몇 개를 먹고 저절로 토했던 날이 있다.
그 순간 폭식이 주는 순간적인 가짜 안도감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고 사람들에게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털어놓으며 의외로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보고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며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용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만의 기준 찾기
나는 나만의 기준을 찾기 위해 텔레비전이나 광고 속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강한 여성을 찾기 위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로 눈을 돌렸다. 평생 알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날씬한 몸매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차츰 혐오감 없이 거울을 보게 되었다. 해변에 가고 바다 수영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어릴 때 괴롭힘당했던 일이 되살아날까 봐 겁내지 않게 됐으며 헬스장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쉽지 않은 내 몸과 화해하기
아직도 폭식을 완벽하게 끊은 것은 아니지만 불안을 떨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불안에서 벗어나며 나만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언제 마지막으로 폭식을 한지 기억이 안 난다. 물론 여전히 음식을 좋아하지만 정신적 탈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평생 자기 몸을 증오하고 괴롭힌 사람이 그 몸을 다시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예전처럼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내 상처가 전부 아물지는 않았다. 때때로 다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당당히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며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인용된 모든 출처는 우리 팀에 의해 집요하게 검토되어 질의의 질, 신뢰성, 시대에 맞음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참고 문헌은 신뢰성이 있으며 학문적 또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 Allende, I. A. A. (2020). Gordofobia, una lectura desde (y para) el Trabajo Social. Perspectivas: revista de trabajo social, (35), 109-133.
- Cuadro, E., & Baile, J. I. (2015). El trastorno por atracón: análisis y tratamientos. Revista mexicana de trastornos alimentarios, 6(2), 97-107.
- Mancuso, L., Longhi, B., Perez, M., Majul, A., Almeida, E., & Carignani, L. (2021). Diversidad corporal, pesocentrismo y discriminación: la gordofobia como fenómeno discriminatorio. Inclusive, 4(2), 12-16.
이 텍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